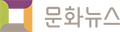[문화뉴스 강인 ] 『‘박제(剝製)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천재’라 불리는 작가 ‘이상(李箱, 1910~1937)‘의 <날개>라는 단편소설의 시작과 끝부분 문장입니다.
이상의 얼굴은 울상이 되고 있습니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본명이 김해경(金海卿)인 이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경성고등학교 공업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 건축과에 근무했으나 폐결핵으로 3년 만에 퇴직하여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다가 27세인 19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쓴 단편소설 <날개>는 천재이면서도 자신의 생계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매춘부(賣春婦)인 아내에게 얹혀살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자신을 1인칭 ‘나’로 표현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이 소설은 매춘부 ‘금홍’과 부부의 연을 맺은 ‘나’는 병든 몸으로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살아갑니다. 아내는 매춘부라는 직업상 늘 집안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 관계를 맺지만 그런 모습을 ‘나’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번뇌로 점점 지쳐갑니다.
이상의 <날개>는 이처럼 현실에 대한 무관심 속에 권태로운 삶을 사는 1930년대 순수 심리적인 작가 이상의 자서전적 소설작품입니다.
필자가 이 작품을 처음 읽은 것은 고등학생 시절로 당시는 내용이 난해하여 깊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후 청장년 시기를 지내며 몇 차례 더 읽어 보았지만 그때마다 못마땅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말을 너무 희망적으로 해석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추락(墜落)’입니다. 추락을 극복하는 방법은 작가의 표현대로 겨드랑이에서 돋아난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이는 극히 비현실적이거니와, 또한 주인공을 지칭하는 ‘나’의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추락’보다는 ‘비상(飛上)’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혹 소설 속에 ‘나’가 현실의 ‘나’와 닮아서일까요?

사실 필자도 마치 '이상'의 <날개>라는 단편소설 속에 나오는 무기력한 주인공이 되어버린 듯한 삶 속에서 수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소설에 다시금 심취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심리(心理)가 공감되어, 읽고 또 읽고 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미로(迷路)를 빠져나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위한 글이라 여겨집니다.
날개, 그것은 사람의 가장 순수한 소망의 형상이자 구원의 매개물입니다. 땅 위의 고통과 번뇌와 숨 막힘이 처절하게 번져갈수록 사람의 날개에 대한 소망은 더 가벼이 허공을 날아갑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약한 인간의 도피처일 수 있습니다. 아니, 현실을 외면한 비겁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 밤 여러분의 겨드랑이에 날개를 달아 보십시오. 아니, 날개가 돋는다는 느낌이라도 가져 보십시오. 그러면 빈곤 때문에, 또는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파블로 사라사테(Pablo de Sarasate, 1844~1908)’의 <찌고이네르바이젠(Zigeunerweisen)>이라는 바이올린곡을 소개합니다.
에스파냐어로 ‘찌고이네르(Zigeuner)’는 ‘집시’이고 ‘바이젠(Weisen)’은 ‘선율’이라는 뜻으로, 흔히 ‘집시의 노래’로 불리는 <찌고이네르바이젠>은 스페인 피레네산맥 일대를 유랑하는 집시들에게 전해오는 전통 춤곡을 소재로 사라사테가 쓴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집시음악의 대표적 작품입니다.
바이올린 연주가는 물론 작곡가로서도 천재성을 지닌 이탈리아 출신 사라사테가 1878년에 작곡한 <찌고이네르바이젠>은 집시풍의 느낌을 전해주는 이국적 선율이 매력적입니다.
어쩌면 이상의 삶이 집시를 닮았다는 생각에 이 곡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 3부로 되어있습니다.
제1부 : 모데라토(보통 빠르기로). 제2부 : 운 포코 피유 렌토(좀 더 느리게). 제3부 :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파블로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Op. 20.>
한국의 자랑스러운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Sarah Chang)와 플라시도 도밍고(Plácido Domingo)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Berline Philharmony Orchestra)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곧 바이올린의 천재 사라사테의 <집시의 노래>가 한국이 낳은 또 한 사람의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의 날개를 타고 비상(飛上)하는 것을 보고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ablo de Sarasate 1. Moderato 2. Un poco piu lento 3. Allegro molto vivace Sarah Chang, Violin/ Plácido Domingo, Cond. Berline Philharmony Orchestra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가 언뜻 생각납니다. 마치 그리움과도 닮은 떠오름입니다.
오늘 같은 초여름날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권태로운 햇살이 거리마다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를 생각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천재를 만들고, 자신의 부요와 권력을 자랑함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잔인한 자들이 활보하는 기막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전긍긍하며 부질없는 생각에 하릴없이 빈둥거릴 때, 그가 남긴 몇 마디 말과, 그가 토한 붉은 선혈과, 그가 눈 뜨고 죽어야 할 정도로 원통스러웠던 세상 이야기가 그를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날기 위해 요절(夭折)한 어느 [천재의 날갯짓]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의 마지막 손에 쥔 레몬 향기가 이 밤을 휩싸고 돕니다.

강인
예술비평가
사단법인 카프코리아 대표
국민의힘 국가정책 자문위원(문화)
문화뉴스 / 강인 [email protected]